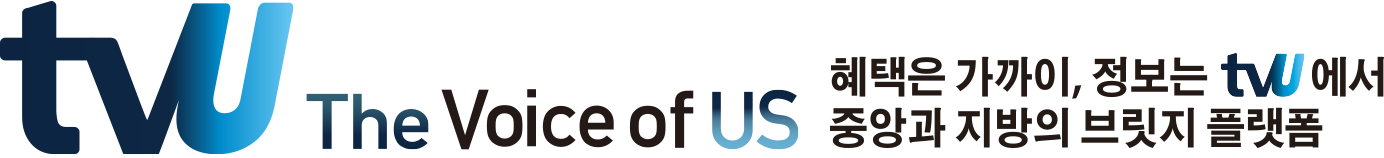푸드 뱅크가 단순한 나눔의 차원을 넘어 복지를 실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큐 ‘행복한 나눔의 밥상, 푸드 뱅크’를 따라 진화하고 있는 국내외 푸드 뱅크 시스템을 소개한다.
기획 | 편집부
미국 최대 도시 뉴욕 북서쪽에 있는 유니온 스퀘어에서는 주말마다 ‘파머스마켓’에서 장터가 끝난 뒤 커다란플라스틱 통을 끌고 나타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시티하비스트(City Harvest)라는 음식구조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인데, 장이 끝난 뒤 이들은 팔고 남은 농산물을 농민들로부터 기부 받아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하는역할을 한다.
전 세계에서 한 해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은 무려 13억 톤. 음식물 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그래서 그냥 두면 버려질 음식들을 모아 저소득층에 기부하는 푸드 뱅크 제도가 민과 관을 가리지 않고 활성화되고 있다. 시티하비스트는 연간 2만5000톤의 음식물을 모아 500여 곳의 단체, 140만 명에게 음식을제공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것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나눔 아이디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푸드 뱅크
지자체 각종 복지사업 실시에도 좋은 매개로
이같이 수거된 음식은 무료급식소나 저소득층 대상 푸드 마켓에서 배분된다. 국내에서도 1998년부터 푸드 마켓이 생겨났는데 푸드 마켓도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저소득층 대상 푸드 마켓은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가 대세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푸드 마켓이 방문하는 날이면 장을 보곤 한다는 김신영(61) 씨는 “다리가 불편해 일을 못하고 장거리로 이동하기도 힘들다”며 “여기서 오래 쓸 수 있는간장 등을 구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한다.
이동형 푸드 마켓은 지방자치단체가 방문형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는 좋은 매개가 되기도 한다. 파주시의 경우 푸드 마켓과 함께 무료진료서비스, 빨래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도 이 같은 푸드 뱅크의 순기능에 주목하고 푸드 뱅크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문환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장은 “푸드 뱅크를 앞으로도 활성화기 위해 대형유통업체나 기업과 MOU를 체결함으로써 적재 적소의 주민들에게필요한 푸드 뱅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팸이나 통조림은 ‘비싸게’ 채소나 고기는 ‘싸게’
저소득층 건강까지 고민하는 푸드 뱅크
미국 필라델피아시는 식품보급소(Food Pantry)를 설치, 소비자가 방문해 필요한 음식과 물품을 선주문할 수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다. 종래 푸드 뱅크는 남는 음식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었는데 이 같은 방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식품보급소에서는 ‘영양사’도 상주해 식품을 선택하는 저소득층 건강을 고려해 균형 잡힌 식품을 주문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식품보급소는 가격을 통해 소비자의 물품 선택을 유도하기도 한다. 즉, 스팸이나 통조림같이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은 비싼 값에, 신선하고 영양소가 많은 고품질 식재료는 저렴한 값에 판매하는 것이다. 이곳에서물건을 구매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한정된 정부 지원금으로 물품을 구매하기에 좋은 식재료를 고를 수 있다. 푸드 뱅크가 단순한 나눔의 차원이 아니라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까지 고려한 복지정책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복지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도움 주는 푸드 뱅크의 효과
미국 농무부는 1960년대부터 긴급식량구호프로그램(TEFAP)을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농무부에서 직접 구매하여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배분하는 프로그램인데, 2015년에만 6억7000달러어치의 품질 좋은 농산물이 이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배분됐다.
이를 통해 미국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과 저소득층을 함께 도우며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다이앤 크리비스키 미 농무부 영양보충지원대책부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국내 농업을 지킬 수 있고 도움을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함은 물론 일정량의 제품 구매가 항상 이뤄지도록 해 농산물 시장의 안정성도 지킬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이 푸드 뱅크는 단순한 나눔의 차원을 넘어서 부족한 국가의 복지와 경제를 일정부분 메울 수 있는 ‘묘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 같은 순기능 때문에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푸드 뱅크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하니, 이 다큐를 계기로 대한민국 지자체도 푸드 뱅크 활성화를 고민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