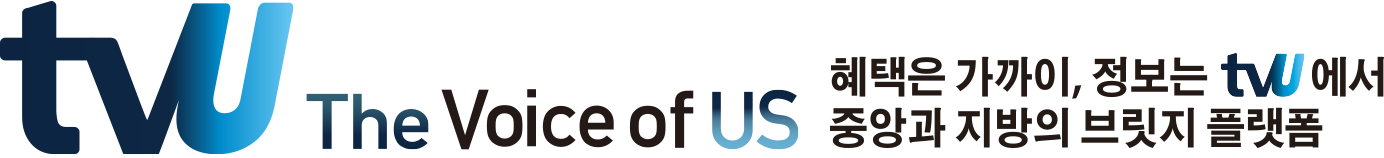어느 곳은 돈이 늘고, 어느 곳은 돈이 줄어든다. 냉엄한 자본주의 현실 앞에서 당연히 분쟁이 발생할 텐데 행정자치부가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지방재정 개편’ 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개혁은 시·군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도입된 조정교부금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고, 법인소득세 중 일정 부분을 시·군 공동세로 전환해서 재정이 어렵고 세원이 없는 자치단체에 세수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한 4월 22일 박근혜대통령도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앙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지방재정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며 “지방재정의 군살은 과감히 빼고,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해서 재정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언급해 지방재정개편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행자부 “조정교부금 제도 왜곡돼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 특례 폐지 반드시 필요“
본지 6월호에 다룬 대로 행자부가 마련한 지방재정 개편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① 조정교부금 제도가 현재 잘못 운영되고 있으니, 이를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 ②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며 기초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더 벌어졌으니, 일부를 다시 공동세로 전환해 시·군 형편에 맞게 재분배하자는 것이다.문제는 하위 쟁점이다. 행자부는 조정교부금 조정 시 재정력지수 반영 비율을 높여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 돈이 더 많이 가게 하자는 입장인데, 경기도의 경우 6개 불교부단체 우선 배분 특례가 있어 “비율을 높여봤자 안 먹힌다”는 것. 그래서 행자부는 이 특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법인지방소득세도 2013년 독립세로 전환되며 기초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극대화시킨 주범이라고 판단했다. 행자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와 연천군의 경우 2014년 154배 차이 나던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실적이 2015년에는 325배로 벌어지는 등 세수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일부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 도(道)가 각 기초지자체 형편에 맞게 재분배하는 것을 추진하고있다.
행자부 “지방재정 좋아지고 있다. 6개 불교부단체 남는 돈도 많다”
행자부는 이번 지방재정 개편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을 위협하고 불교부단체의 재정파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과한 반응’이라는 입장이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비과세 감면정비, 영유아보육료 국가보조비율 인상 등으로 2013년 53조 8,000억 원이던 지방 세수가 2015년 71조원으로 18조 원 가량 늘어났다”며 지자체의 여력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의 경우 2014년 특별회계 결산 결과 예산에서 결산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2,933억 원 규모라며 경기도 나머지 25개 기초지자체 평균 1,031억 원의 거의 3배에 달하며, 전국 226개 시·군·구 평균인 581억 원과 비교하면 5배가 넘어무리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관계자 “세원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 제외하고는 지방재정 개혁 많은 공감 얻고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세원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지방재정 개편의 대의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많은 수의 농·어촌 기초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의 숨통을 약간이나마 틔울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인상안의 경우 법률 개정 사항이라 더더욱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를 거친 후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학자들도 어느 정도 취지는 동감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조정교부금은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인데 넉넉한 지자체에 우선 집중시킨다는 것은 취지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 농·어촌 기초지자체들도 속속들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