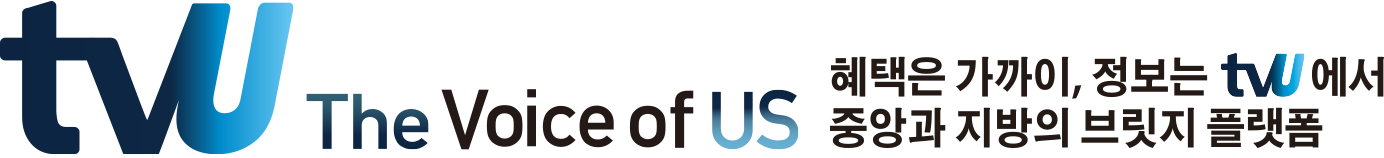최근 지구적으로 능력주의가 큰 관심을 모아왔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오늘날 자본주의는 세습주의가 부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능력주의는 세습주의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다. 둘째, 능력주의가 강조되면 될수록 불평등의 새로운 원인이 될 수 있다. 능력주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능력주의
21세기 서구사회에서 세습주의의 부활을 경고한 이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다. 그는 말한다. “2010년대에 접어든 오늘날, 필경 사라진 듯했던 부의 불평등이 역사적 최고치를 회복하거나 심지어 이를 넘어서는 수준에 다다랐다. (중략) 2008년 세계 경제위기는 21세기의 세계화된 세습자본주의 최초의 위기다.”
피케티의 논리는 분명하면서도 설득력 높다.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인구 성장과 기술 진보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성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자본의 소득 몫이 커지며 그 힘이 더욱 강력해지는 세습자본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작 《21세기 자본》에서 내놓은 결론이다.
능력이 아니라 태생에 따라 사회적 계층화가 이뤄지는 ‘신(新)세습사회’의 도래는 오늘날 안타깝게도 지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습은 곧 ‘부의 대물림’이다. 서구사회의 경우 막대한 상속세를 지불한다 해도 부모의 부를 자녀가 물려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저계급론’에서 볼 수 있듯 예외가 아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세습주의는 전통사회의 재생산 원리였다.
태생을 중시하는 이 세습주의에 맞선 것이 재능과 노력을 중시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다. 능력주의라는 말을 주조한 이는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지만, 능력주의는 근대 초기 민주주의자들이 품은 이상이었다.
미국 독립선언문 초안 작성자이자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능력주의를 사회 이념으로 정립한 이들 중 하나였다. 제퍼슨의 꿈은 출생과 부에 뿌리를 둔 귀족이 사회를 주도했던 구대륙 유럽과 달리 재능과 천재성에 근거한 귀족이 등장할 수 있는 나라를 신대륙에 세우는 데 있었다. 재능 있는 이가 노력을 기울이면 누구나 엘리트인 ‘자연적 귀족’이 될 수 있다는 게 제퍼슨의 논리였다. ‘아메리칸 드림’의 철학적·역사적 기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능력주의는 대단히 매혹적인 담론이다.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중시하는 근대 능력주의는 중세 신분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연줄과 배경이 아니라 성실과 교육이 성공의 핵심 요소라는 믿음은 미국 사회를 지탱해온 기본 가치였다.
능력주의에 대처하는 방법
이러한 능력주의가 거침없는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는 1980년대 이후 열린 신자유주의 시대다. 신자유주의
는 시장에서 개인의 경쟁력 향상을 중시하는 담론이다. 문제는 능력주의를 그대로 놓아두면 소득의 격차로 인해 불평등이 증대한다는 점이다. 기회의 평등만으로 사회적 평등을 성취하기는 어렵다.
오늘날 서구사회 능력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다.
첫째, 능력주의는 세습주의에 맞설 유력한 대안이다. 이때 기회의 평등은 사회적 평등의 출발점이다. 계층
과 젠더를 넘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어느 사회든 매우 중대한 사회적 과제다. 이 점에서 능력주의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둘째, 세습주의가 능력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숙고해야 한다. 대물림된 부는 일부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결국 기회의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층계급 아이들은 중산층 아이들보다 교육과 구직 등의 기회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기회의 평등이 결과의 불평등으로부터 작지 않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바로 이 점에서 모든 이에게 최대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정부는 경제·사회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
요컨대 능력주의는 빛과 그늘을 동시에 가진다. 세습주의에 맞설 현실적 대안인 동시에 그 한계 또한 분명한 대안이다. 오늘날 정말 역설적인 것은, 능력주의가 자신이 몰아내려 했던 세습주의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습주의에 맞설 강력한 대안은 능력주의와 재분배정책, 다시 말해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동시에 강화하고 적절히 결합하는 데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세습주의와 능력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먼저 세습주의의 강화에 맞설 제도적 처방이 요구된다. 사라지는 계층사다리를 다시 세우지 않는다면 불평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소득·자산·상속에 대한 전향적 조세정책을 강구하며 좌절한 이들을 위한 패자부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청된다.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쟁점이기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놓아둘 순 없다. 특히 결과의 평등을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 및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