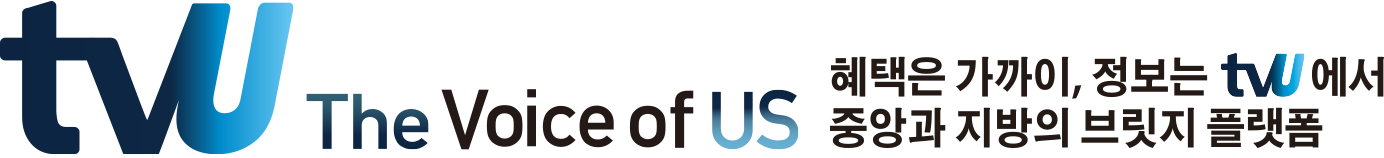이스라엘은 현재 GDP의 5.6%를 R&D에 투자하는 세계 1위의 혁신국가다(OECD, 2023). 이스라엘 정부가 1993년 도입한 정부-민간 공동 벤처투자 프로그램인 요즈마(Yozma) 펀드는 벤처투자 시장의 게임체인저였다. 1993년, 벤처투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정부는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80%를 민간 벤처캐피털과 매칭 형태로 투자하도록 설계했다.
정부가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신, 민간 벤처캐피털(VC)과 함께 펀드를 조성해 초기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일정 기간 후 민간이 정부 지분을 되살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즉, 정부가 혁신의 리스크를 함께 감수하되, 성공의 보상은 민간에게 돌려주는 구조였다. 이 모델은 이후 정부가 혁신을 돕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 30여개국이 벤치마크했다. 이 ‘리스크는 공유하고, 이익은 민간에 돌려주는’ 메커니즘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자본을 폭발적으로 유입시켰다.
요즈마의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기술, 정보통신, 의료기기 등 고급 기술인력이 풍부했지만, 시장 진입 자본이 부족했다. 즉, 기술 역량이 성숙한 단계에서 자본시장 구조를 개입시켰기 때문에, ‘정책이 시장을 대신한 게 아니라 시장을 열어준’ 셈이다. 이 전략적 타이밍 덕분에 정책은 왜곡 없이 산업화로 이어졌다.
셋째, 외국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유치한 점이 다. 요즈마는 외국 VC가 이스라엘 펀드에 공동출자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그 자금을 동일 조건으로 매칭했다. 이는 단순한 외자유입이 아니라 지식과 네트워크의 이전(technology spillover)효과를 낳았다. 실제로 미국계 펀드인 제미니(Gemini), JVP, 피탕고(Pitango) 등은 모두 요즈마 출신으로, 현재 이스라엘 VC 시장의 60% 이상이 이 프로그램에서 파생된 조직들이다.
현재는 Israel Innovation Authority(IIA)가 이를 계승해, 스타트업 펀드, R&D 보조금, 글로벌 브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Deep Tech’ 중심 지원이 뚜렷해, AI, 바이오, 로보틱스, 방산기술 스타트업에 비중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투자 유치 규모는 GDP 대비 1.8%로, OECD 평균(0.3%)의 6배다.
요즈마의 가장 큰 혁신은 단순히 돈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리스크 분담과 퇴로 설계’를 결합한 구조였다.
넷째, 요즈마는 제도 설계의 완성도와 학습 구조가 매우 정교했다. 펀드별 수익 배분, 손실 분담 규정, 공동투자(syndication) 원칙, 관리비 구조 등 모든 운영 규범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 이 덕분에 정부 보조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제도적 학습 플랫폼으로 작동했다. 각 펀드는 실패 사례와 성공 모델을 공유하며, 이후
민간 시장 전체가 성숙해졌다.
마지막으로, 요즈마는 정책의 유연성과 지속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펀드가 자리를 잡자 곧바로 민간에 지분을 넘기며 시장에 자율성을 부여했고, 이후 ‘요즈마 2.0’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기관투자자와 딥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결국 요즈마의 성공 비결은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철학에 있었다. 정부는 시장을 대신하지 않고, 시장에 진입할 용기를 만들어주는 제도를 설계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20년 만에 인구 1,000만 명 미만의 국가임에도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스닥 상장 기술기업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
[지방정부티비유=최원경 리포터 <빅테이터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