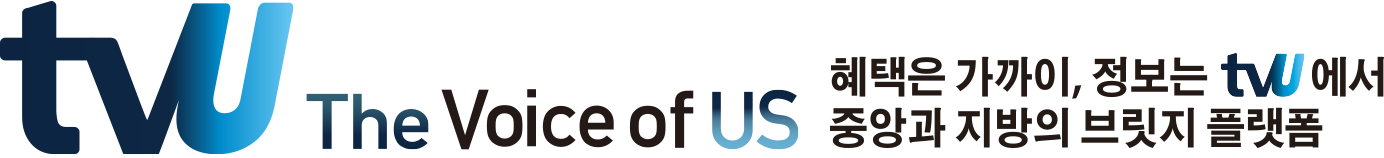핀란드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연구, 혁신 지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2023년 기준, 영국 과학혁신네트워크(UK Science & Innovation Network)는 핀란드를 글로벌 혁신지수 6위 국가로 평가했고, 핀란드 의회는 공공 R&D 투자 비중을 GDP의 4%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통계청(stat.fi)에 따르면 핀란드 기업의 61.5%가 혁신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들 기업의 혁신 매출이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핀란드가 혁신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일상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핀란드의 혁신 정책 구조는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전략 중심의 클러스터 플랫폼인 SHOK(Strategic Centres for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제도, 둘째는 도시 중심의 혁신 허브 모델, 즉 에스푸(Espoo)를 중심으로 한 ‘시민 참여형 혁신 생태계’이다.
이 두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핀란드의 국가 혁신 시스템(NIS)을 형성한다. 2006년 도입된 SHOK 제도는 정부, 기업, 대학이 공동으로 특정 산업(에너지, 헬스케어, ICT 등)에 연구거점을 설립하고 협력하는 모델이다.
SHOK는 비영리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되며, 산업계 대표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주주로 참여한다. 핀란드 혁신청(Tekes, 현Business Finland)은 연구비의약 40~60%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한다. 이러한 공동 투자 구조는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산업 수요와 연구 과제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SHOK의 핵심은 ‘수요 기반 혁신(demand-based innovation)’이다. 이는 정부가 연구 주제를 정하는 대신, 기업이 제시하는 기술적 수요와 시장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연구성과는 현장 수요에 맞게 빠르게 사업화 되었고, 기업, 연구소 간 협력도 더욱 촘촘해졌다.
물론 한계도 있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SHOK가 지나치게 기존 산업 중심으로 운영돼 획기적 혁신(breakthrough innovation)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SHOK는 핀란드 혁신정책을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에서 ‘산업과 사회가 함께 설계하는 연구’로 전환한 제도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즉, 공동 거버넌스를 제도화한 세계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핀란드 수도 헬싱키 인근의 에스푸(Espoo)는 그 자체가 하나의 혁신도시로 기능한다. ‘Espoo Innovation Garden’은 이 도시의 상징적 혁신 허브로,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 노키아(Nokia), 코네(Kon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이 한데 모여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이 허브에는 5,000명 이상의 연구자, 25개 연구기관, 1,500여 개 스타트업, 6,000명 이상의 학생이 활동하며, 연간 수천 건의 협업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Espoo는 단순한 과학단지가 아니다. 이곳에서는 연구개발(R&D), 창업, 시민 실험이 융합되며,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이 동시에 일어난다. 예컨대 교통 인프라 개선, 에너지
절감 실험, 도시 공간의 데이터 기반 관리 등은 시민 참여형 실험 프로젝트로 운영된다.
핀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StartupBlink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26% 성장, 스타트업 수는 약 1,057개, 투자 유치액은 18억 7천만 달러(1.87B USD)를 넘었다. 또한 2024년 기준, 핀란드 스타트업 고용 인원은 약 36,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인구 대비로 보면 유럽 내 최고 수준의 창업 고용 비중이다.
핀란드 혁신정책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거버넌스 중심의 협업 구조와 공간 기반의 혁신 생태계다. SHOK는 산업 수요와 연구를 정렬시키는 제도적 플랫폼을 마련했고, 에스푸는 그 협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도시 모델을 제공했다. 이 두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핀란드는 국가 전체가 ‘연결된 실험실’처럼 작동하게 되었다.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대전, 광주, 울산 등 연구 중심 도시에서 에스푸형 융합 허브 모델을 도입해 대학–기업–연구기관이 한 공간에서 협업하고 실험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혁신 지표(기업 참여율, 매출 비중, 고용 효과 등)를 정기적으로 측정,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
이 중요하다.
[지방정부티비유=최원경 리포터<빅데이터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