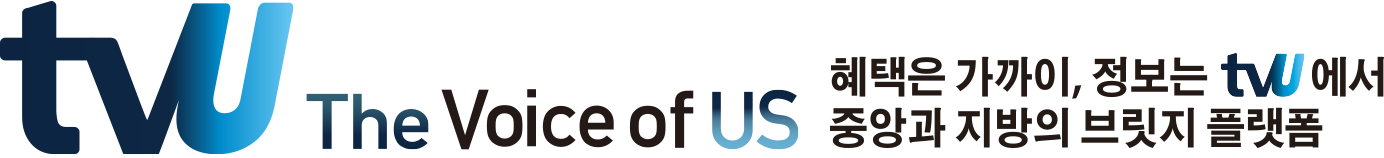"구겐하임 미술관의 유치로 인해 발생된 수익은 공항, 고속철도, 항만, 지하철, 트램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시설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을 거듭하면서 도시 전체를 새로이 탈바꿈시키는 엄청난 시너지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21세기의 도시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며 진화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두에 늘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빌바오효과(Bilbao Effect)’다.
스페인 북부의 군소 도시인 ‘빌바오’는 한때 광업, 철강, 조선 산업으로 번창했었지만, 자원의 고갈과 중공업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실업률이 30%에 육박할 정도의 반사 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1997년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이 들어서면서 이 도시는 순식간에 연 100만명이 찾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변모하였다. 이를 가르쳐 ‘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빌바오 시도 어찌 보면 무모할 만큼의 과감한 투자를 한 대가로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게 된 것이었다.
바스크(Basque) 지방정부와 빌바오 시는 부지와 건축비를 전액 지원하고 작품구입비, 브랜드 사용료, 운영자금 등의 막대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끝에 유치를 성사시켰다.

바스크 지방정부가 당초 계획한 예산은 1억1960만 달러(한화 약1363억 원)였으나, 실제로 예상치의 2배에 가까운 총 2억 2830만 달러(한화 약 2740억 원)가 투입됐다. 더군다나 당시 95%에 가까운 시민들은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대부분의 자금을 미국에서 빌려와서 경제성이 불확실한 미술관을 유치한다는 것에 대해 거세게 반대했다.
또한 당초 연 4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해야만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와, 총 인구수가 약 35만명인 빌바오 시 입장에서 이는 까마득한 수치로 보였을 것이다.
즉, 빌바오의 사례를 우리의 시각에서 본다면 ‘안 되는 조건’을 모두 갖췄다. 이대로라면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사업심사는커녕 시·도의회 심의도 통과하지 못한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운영수입을 단편적으로만 따져보면 여전히 ‘적자 상태’이다. 관람수입으로는 운영경비의 65~70%만 충당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 우리의 ‘셈법’에 의한 명쾌한 수지타산은 나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바오를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는 이유는 외부 관광객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들이 머무는 동안 소비하는 엄청난 ‘외부효과’를 감안하기 때문이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유치로 인해 발생된 수익은 공항, 고속철도, 항만, 지하철, 트램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및 문화시설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을 거듭하면서 도시 전체를 새로이 탈바꿈시키는 엄청난 시너지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사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빌바오효과’를 내보겠다며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에 뛰어들은 적이 있었지만, 구겐하임 측이 요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모두 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리지 않고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묘수는 ‘외자유치’ 밖에 없다. 그러나 이조차도 중앙정부가 실질적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일례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약 10조원에 달하는 외자유치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아무런 요구나 조건이 없다. 오직 한강변에 부지를 조성하여 제값을 받고 자신들에게 매각해 달라는 것뿐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토지매각에 대한 ‘리스크’를 운운하며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 민선(民選) 지방자치제는 올해로 약관(弱冠)이 되었다. 물론 부모 역할을 하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전히 못미덥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ICT 최강국이 된 배경에는 스무 살 젊은이들의 ‘벤처정신’과 이를 믿고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준 부모들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부모들이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공부나 하라’며 고정적 시각으로 다그치기만 했다면 오늘날의 ‘대박’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어느덧 성년이 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중앙과 지방의 ‘공동체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명확한 ‘관계설정’부터 시급히 재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