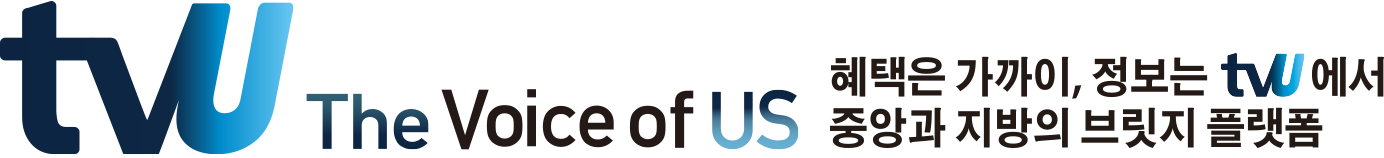기존 자본주의 관념을 뛰어넘는 ‘공유경제’ 개념이 21세기의 시대적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공유경제가 무엇인지, 지자체가 왜 주목해야 하는지 짚어봤다.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하버드대 교수가 2008년 구체화한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차세대 메가트렌드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개념은 한 번 생산된 물품을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 여럿이 차용하거나 돌려쓰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경제 개념은 ‘소유’에 입각한 20세기까지의 전통적인 자본주의 관념과 대비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미래학자 제레미 레프킨의 저서 『소유의 종말』의 영어 원제목인 ‘접속의 시대’(The Age of Access)와도 닿아 있다. 레프킨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세대 들은 소유보다는 접속(Access)에 집착하며, ‘무엇을 살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할 것인가’에 강한 흥미를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런 전망에 걸맞게 공유경제 관련 시장규모는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영국 소재의 다국적 컨설팅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는 2010년 10억달러 규모였던 공유경제는 2025년 3350억 달러까지 급성장하며 전통적인 렌탈 서비스 산업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3월 5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양회(兩會)중 하나인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에서 “체제 혁신으로 공유경제 발전을 촉진해 신흥 산업군을 확대할 수 있는 공유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엔비(AirBnB)의 2015년 현재 기업가치는 240억달러로 호텔체인 세계 2위인 메리어트(Marriot, 210억달러)를 넘어 호텔체인 1위 힐튼(Hilton, 276억달 러)을 위협 중이다.
국내에도 차량 공유서비스 ‘쏘카’나 쉐어링 포털 ‘쏘시오’, 공유 주차장 서비스인 ‘모두의 주차장’ 같은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가 개설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 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유경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 것을 주문했다.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 등도 공유경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공유경제는 이게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트렌드로 자리잡은 것이다.
공유경제 서비스의 장점은 분명하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과소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유휴자원을 활용해 추가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지방자 치단체 차원에서는 공유경제 서비스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추가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도 유발된다.
물론 단점도 상당하다. 타인이 소유하는 물품이나 공간, 서비스를 짧은 기간 점유하는 것일 뿐이다보니 그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전통적인 렌트 기업과는 다르게 개인 등불특정다수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니 질을 보장하기 쉽지 않다. 현재 법령이나 규제에 위배되기도 십상이다. 또한 기존 사업자와의 분쟁의 소지도 다분하다. 이와 관련해 세계적인 공유 택시 서비스인 우버(Uber)가 국내에 들어 왔다가 불법 논란과 택시사업자들의 반발로 한국 시장 에서 사실상 철수한 사례는 유명하다.
그러나 ‘미래의 새로운 개념’이 도래하는 시기에 이 정도 논란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그를 뛰어넘어 새시대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로 가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말대로 ‘손톱 및 가시’ 같은 규제는 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월간 지방자치》는 해외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선진 도시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부가 공유경제를 어떻게 정착·발전시켜 왔는지 살펴봤다. 또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해외 선진국에서의 공유경제 활성화 사례를 소개한다. 더불어 공유경제 도입시의 각종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협업하기 좋은 국내의 다양한 공유경제 기업도 소개한다. 본지는 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2015년 9월 ‘스마트 클라우드쇼 2015’에 참석해 “공유경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간소외, 환경파괴와 같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나 가는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공유경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경제에 얼마나 다양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잘 함축해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서 이만한 단비가 또 있을까? 바로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경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